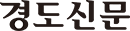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6일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딸 이혜선 씨가 밝혔다. 천경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녀는 우선 우리 화단에 채색화의 붐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필가로서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 그녀가 펴낸 1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가 그림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봉건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었다. 1924년생인 그녀가 동경으로 건너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당시만하더라도 선비들이 그린 수묵화에 비해 채색화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그리는 그림이라 천대받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천경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적인 채색화를 계속 추구해 결국 한국화에서 채색화가 보편화되는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그녀의 그림은 여인과 꽃, 그리고 뱀으로 대표된다.
그래서 그녀는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린다. 그의 화풍을 보노라면 어쩐지 중남미나 하와이, 또는 아프리카 풍의 색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녀가 전남여고 교사나 홍익대 미술대 교수의 자리를 그만두고라도 세계여행에 나서서 당시 산수화가 지배적이던 우리나라 화단에 해외의 화풍이나 이미지즘을 강렬하게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할 만한 작품을 꼽으라면 서른다섯 마리의 뱀을 화폭에 담은 작품 ‘생태’이다.
검푸른 색의 독사와 검붉은 독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그림은 당시 풍경이나 정물, 인물화가 주류였던 화단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잇단 결혼의 실패와 아버지와 여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이후 삶에 대한 특유의 한(恨)의 정서가 이때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이 그림이 1952년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열린 그녀의 개인전에 출품됐을 때 ‘여자가 뱀을 그렸다’며 입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다.
천경자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된 것은 위작 논란에 휩싸인 ‘미인도’이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를 보고 천경자는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여려 가지 검증 경로를 거쳐 진품이라고 밝힘에 따라 천경자는 “내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고언을 남기며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품으로 오도하는 화단 풍토에선 창작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붓을 놓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한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천경자의 새로운 그림을 만나지 못한다.
본인이 절필하면서까지 내 작품이 아니라는데도, 위작을 그렸다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그 작품이 진품이라며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게 묻고 싶다.
그 그림을 내려서 얼마나 큰 손해가 날 런지는 모르겠지만 작가 자신이 아니라면 내리고 천경자의 다른 그림을 걸어야 했음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모자를 쓴 여인’이다. 몽환적이고 애틋한 눈빛의 여인은 바로 자신의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길례언니’를 비롯해 ‘초원’ 연작과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탱고가 흐르는 황혼’, ‘막은 내리고’ 등의 수작들은 지금도 미술관 전시와 경매시장 등에서 자주 입에 오른다.
그녀는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있나 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아요.”라고 평소에 말해왔다.
그녀의 화풍은 화려했지만 인생사는 고단했다. 화가로서의 성공과는 달리 개인사는 불행했다.
젊은 시절의 아픔을 승화하여 강렬하고도 몽환적인 화풍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녀가 아픔이 없는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먼 이국땅 뉴욕의 맨해튼에서 쓸쓸히 숨져간 천경자, 이제 그녀를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경자를 더욱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평탄한 길보다 험난하지만 가고 싶은 길을 택했고, 우리에게 ‘무얼 먹고 사는냐’보다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를 크게 가르쳐준 우리의 큰 스승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